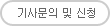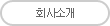Music.Rising
[초점] 가요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상한 표현들’
17.08.25 14:30
영어 공부를 하다보면 오직 한국에서만 존재하거나, 원래의 의미나 용법과 전혀 다른 엉뚱한 의미로 쓰이는 일명 '콩글리시'들을 접하게 된다.
'콩글리시'처럼 가요계에서도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오남용되는 용어들을 종종 살펴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싱글 앨범'과 '티저', '컬래버레이션(콜라보레이션)'이다.
▲싱글 앨범(Single Album)

먼저 '싱글'과 '앨범'은 레코드의 규격을 구분짓던 SP(Standard Playing), EP(Extended Playing), LP(Long Playing) 등에서 파생된 단어다.
이중 가장 먼저 발명된 SP는 녹음 약 3~4분정도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대중 음악의 곡의 길이가 대략 3~4분 정도인 것도 이에 기인한다.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녹음시간이 약 20분정도까지 늘어난 EP가 등장했고, 당연히 EP는 수록되는 곡의 수도 4~5곡정도로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녹음 시간이 약 40분 정도까지 늘어난 LP가 발명돼 수록되는 곡도 9~10곡까지 늘어나게 됐다.
또 LP는 발명 초창기에 주로 여러가지 인기 음악을 수록하는 편집 음반으로 사용됐고, 이에 LP를 '앨범(Album)'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또 SP는 '싱글(Single)'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EP를 '미니 앨범'으로 부르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다. EP가 싱글보다는 곡의 수가 많고 앨범보다는 적기때문에 이런 용어가 탄생했지만, 사실 미니 앨범은 곡의 수가 아니라 기존보다 크기가 줄어든 새로운 규격의 LP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였다.
보통 해외에서는 EP를 싱글이나 앨범과 같은 다른 용어로 지칭하지 않고 EP라고 부르고 있으나 4~5곡이 수록된 30분 내외의 음반이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돼 있다.
즉, 싱글이면 싱글, 앨범이면 앨범, EP면 EP이지 '싱글 앨범'이나 '미니 앨범' 등의 단어는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용어인 셈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왜 이런 이상한 표현이 등장한 걸까. 이는 자연스럽게 SP에서 EP, LP로 음반시장이 넘어온 해외와는 다르게 국내 가요계는 SP와 EP 시장을 건너뛰고 LP 위주의 음반 시장이 형성된 것에 기인한다.
1~2곡이 싱글이나 10여곡이 수록된 앨범이 모두 제작비는 유통비는 비슷하게 소요됐고, 당시 상인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싱글보다는 앨범을 선호한 게 당연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싱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됐고, '음반=앨범'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이런 인식은 테이프와 CD의 시대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수들이 음반을 앨범으로 발매했기에 '싱글 앨범'과 같은 기묘한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문제는 음악 시장이 음반에서 음원으로 넘어오면서 발생했다. 피지컬 음반이 쇠퇴하고 1~3곡 단위의 음원을 유통하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앨범이 아닌 싱글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음반=앨범'이라는 인식이 겹쳐지며 '싱글 앨범', '미니 앨범'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는 싱글이든, 앨범이든, 싱글 앨범이든, 우리나라에서 의미만 통하면 괜찮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K-POP 시장의 영역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것이 옳아 보인다.
▲티저(Teaser)

티저의 사전적 의미는 '예고 광고. 상품 이름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거의 알려 주지 않아 호기심을 갖고 다음 광고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광고'로, 다시 말해 정보를 감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광고 기법을 뜻한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티저 CF는 1999년 임은경이 출연했던 TTL CF가 꼽힌다. 당시 SK텔레콤은 이름도 나이도 알려지지 않은 완전한 무명의 소녀를 모델로 내세워 TTL이라는 문구외엔 일체의 브랜드명이나 상품 소개가 포함되지 않은 파격적인 광고를 선보였고 이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이후 TTL은 SK텔레콤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았고, 'TTL 소녀'로 불리던 임은경도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처럼 티저는 정보를 감춤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법을 뜻하지만 현재 가요계에서 사용되는 '티저'의 의미는 본래의 뜻보다 단순한 '예고'에 가깝다.
실제 요즘 컴백을 앞둔 가수들이 공개하는 '티저 이미지'나 '티저 영상'은 가수명과 제목, 발매일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초창기에는 TTL의 사례를 본 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미지나 사운드 영상 등을 노출하는 티저 기법으로 재미를 본 가수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티저 기법이 흔해지고 사람들 역시 식상함을 느끼자 티저의 의미는 점차 컴백 예고에 그치는 수준으로 변질됐고, 이제는 '으레 붙이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정확히는 '티저 이미지'는 '콘셉트 이미지', '티저 영상'은 '트레일러(trailer)'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컬래버레이션도 티저와 비슷한 경우다. 너무 무차별하게 쓰이면서 본래대로라면 쓰일 수 없는 곳까지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컬래버레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둘 이상의 브랜드가 손잡고 새로운 브랜드나 소비자를 공략하는 기법'으로, 나이키가 만화 슬램덩크의 작가 이노우에 다케히코와 손잡고 '조던6 슬램덩크', '조던 슈퍼플라이3 슬램덩크' 등을 발매한 것이 좋은 예다.
가요계에서도 몇몇 스타들은 패션브랜드나 스포츠 브랜드 등과 손잡고 특별한 에디션을 내놓곤 하는데, 이 역시 컬래버레이션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컬래버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행을 하면서 엉뚱한 곳에서까지 컬래버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A라는 래퍼의 신곡에 B라는 아이돌 멤버가 단순히 훅(Hook) 파트의 보컬로 참여했다면 이는 '피처링'으로 표기해야 옳다. 조력자나 게스트에 가까운 피처링과 협업자에 가가운 컬래버레이션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두고 'A와 B의 컬래버레이션'이라며 과장된 마케팅을 펼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K POP의 영역은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로 나아간 산업이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공연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의미만 통하면 됐지'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최현정 기자 gagnrad@happyrising.com
※ 저작권자 ⓒ 뮤직라이징.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Music.R NEW
-
크러쉬, 랜선 콘서트 'Homemade... (2)
최현정 | 20.05.15 10:51
-
비투비 서은광, 21일 선공개 싱글 ‘...
최현정 | 20.05.13 10:22
-
타이거 JK X 알리 벤슨, 코로나 19 ...
최현정 | 20.05.12 14:47
-
‘웨딩보이즈’ 정용화∙이준∙윤두준∙...
최현정 | 20.05.12 14:31
-
신인 걸그룹 레드스퀘어, 개인 콘셉...
최현정 | 20.05.12 14:22